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서쪽으로 30분쯤 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볼로뉴숲. 이곳엔 길이 150m, 높이 46m의 거대한 배가 놓여 있다. 콘크리트, 유리, 나무가 만들어낸 곡선이 마치 파도를 가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뱃머리를 닮았다.

‘해체주의 건축의 왕.’ 건축계는 캐나다 출신 건축가 게리를 이렇게 부른다. 그럴 만하다. 스페인의 쇠락한 공업도시 빌바오를 세계적 관광지로 되살린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랜드마크인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등 파격적인 건축물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태어났으니. 그가 1989년 건축계에서 최고로 영예로운 프리츠커상을 거머쥔 배경이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장 중 거장’이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학교 친구들은 게리를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라고 놀렸다. 그는 커선 유대인 사이에서 ‘아웃사이더’였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여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대인은 그의 독특한 건축을 만든 정체성이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회고했다. “탈무드는 모든 것에 대해 ‘왜?’라고 물어보라고 가르쳐요. 이 ‘왜’라는 질문이 평생 나와 내 건축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진 ‘왜?’라는 질문은 독창성의 열쇠가 됐다. 왜 건축은 항상 네모반듯해야 할까. 직선 대신 곡선과 사선을, 대칭 대신 비대칭을 쓰면 안 될까. 그렇게 태어난 게 미국 샌타모니카에 있는 게리하우스다. 건축에 잘 쓰지 않는 투박한 체인 링크를 얼기설기 얽고, 값싼 합판과 철판으로 완성한 그의 집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에 “이게 무슨 건축이냐” “아직 공사 중인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굴하지 않고 틀에서 벗어난 건축을 계속 선보였다. 티타늄을 종이처럼 구겨서 만든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듯한 체코 프라하의 댄싱빌딩, 스테인리스스틸을 장미 꽃잎 한 장 한 장처럼 접어 겹쳐낸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감상하다 보면 하나의 ‘조각 작품’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세계 최고 거부로 꼽히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 회장이 게리에게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일 미술관을 의뢰한 것도 그래서다. 이곳 역시 외관이 파격적이다. 아름다운 곡선의 유리 돛 12개가 건물 위를 뒤덮고 있다. 미술관 전면 연못 앞에서 보면 숲속 한가운데 거대한 배가 떠다니는 듯하다.

서울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청담동 명품거리 한복판에 있는 ‘루이비통 메종 서울’이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루이비통 매장, 4층은 루이비통재단이 소장한 작품을 전시하는 ‘에스파스 루이비통’ 전시장이다. 유리를 구부려서 만든 유려한 곡선이 ‘한국판’ 루이비통미술관답다.
게리는 자신의 첫 한국 건축을 통해 한국 고유의 미(美)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약 30년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본 동래학춤과 수원화성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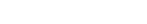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