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초과 공급된 쌀 매입 여부를 의무화시킨 것이 골자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고 있는 핵심 법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합의는 결렬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예고했다.
민주당이 당초 제기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현재는 쌀 시장격리(정부매입)여부가 의무가 아닌 정부 판단에 맡겨져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쌀 의무매입이란 틀은 유지하되, 매입 발동의 기준을 완화시켰다. 1차 중재안은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로, 가격 하락 기준을 5~8%로 높였고, 2차 중재안은 상한을 9%, 15%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1차 중재안까지 수용했지만 2차 중재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란 조건이 붙는 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건을 어떻게 바꾸든 의무매입이 유지되는 한 쌀 공급과잉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시장격리에 투입하게 되면서 정작 스마트화, 청년농 육성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최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주요 농업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의 주요 지지층이던 전라남도 농민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무매입이 쌀값 안정이 될지 미지수라 판단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축산 등 쌀 농사 외 농민단체 상당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농업 예산 가운데 쌀 의무매입에 과중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엔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전체 농가(약 103만 가구)중 쌀 농가의 비중의 절반 수준이다.
민주당으로선 1차 중재안을 통과 시키면 지지기반이라 여긴 쌀 농가와 비(非)쌀 농가 모두에게 비판 받게 된다. 1차 중재안을 '패싱'하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스스로 거부한 꼴이 된다. 원안으로 가도 결국 거부권 행사로 법 통과는 시킬 수 없고, 또 다른 유사 법안을 내놓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23일 이후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민주당과 정부, 여당 모두 양곡관리법 논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식량안보'와 한국의 농업의 미래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실적인 이유를 차치하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인 주요 명분은 식량안보였다. 식량자급률이 44%(2021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이 곧 식량안보로 이어진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흥미로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의 명분도 식량안보다. 농식품부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연평균 20만t씩 초과 생산되는 쌀에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자급률이 2021년 기준 1.1%, 23.7%에 불과한 밀과 콩, 그리고 새롭게 가능성이 열린 가루쌀 재배 면적을 늘려 국내 농업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정부는 여기에 언제든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의 식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곡물엘리베이터, 해외 농장 등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너도나도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선거철마다 지역구 내에 신도시, 산단을 만들기 위해 농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한국의 농지 면적은 현재 152만8000헥타르로 정부가 식량자급률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계선인 150만헥타르에 근접했다. 10년 전인 2013년 171만1000헥타르에 비해 10% 이상 줄었다. 약 6만헥타르 수준인 서울시 3개 만큼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대부분 '표'가 되는 각종 개발 공약 이행을 위해 가격이 싼 농지를 동원한 정치의 결과물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에만 목매는 것도 논의의 시야를 제약하고 있다. 한국과 식생활과 기후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전 세계 113개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 평가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임팩트의 '세계 식량안보 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22년 조사에서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9위에 머물렀다.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37%로 40%대인 한국보다 되려 더 낮다. 자급 역량 자체가 식량안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을 식량안보 강국으로 만든 것은 수입 역량이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지만, 유사시 국민들이 먹을 식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식량안보 관점에서 보면 어른과 아이 수준의 격차가 난다. 일본이 수입하는 곡물 대부분은 일본의 농협인 젠노(전농)이나 미츠비시상사, 미츠이물산, 스미토모상사 등 주요 상사들이 보유한 공급망을 통해 이뤄진다. 한국은 단 2개만을 갖고 있는 곡물엘리베이터를 젠노만도 60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농사에 필수적인 화학비료도 전량이 젠노와 상사가 가진 자산과 공급망을 통해 일본 국내에 공급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경우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자급이 식량안보의 한 축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가 '식량안보'라면 앞으로의 입법 투쟁, 양곡관리법 '시즌2'에선 '자급'뿐 아니라 '수입'까지 포함한 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자급의 주체인 국내 농민으로선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이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해외 농축산물의 수입을 필연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식량안보를 외치면서 '자급'만 외친다면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 65세 이상 농민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된 농촌에서 한정된 농업 예산을 어디에 배분하는 것이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 성장에 도움이 될지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법안을 내더라도 "농업의 미래산업화와 청년농 육성,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기 되는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깨기 힘들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가 필요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현 정부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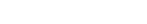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