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붙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무늬만 법인차'로 고가 차량을 등록한 뒤 세제혜택을 받으며 개인이 몰고다니는 '사실상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법인차의 70% 이상이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당 3억원이 넘는 한 슈퍼카 브랜드의 80%가 법인차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번호판' 정책에 대한 이 고가 차량 브랜드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우선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첫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정책이 시작될 때는 연두색 번호판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고, 구매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다. 정말 누가 봐도 법인과 관계 없는 20대 초반 젊은이가 대놓고 슈퍼카의 굉음을 내며 달리는 건 쉽게 눈에 띄게 되겠죠.
하지만 사업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닐 거라는 게 브랜드들의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도 눈에 익기 마련일 뿐더러 나중에는 '사업하는 사람' '부의 상징' 등 오히려 타인과 구분 짓는 차별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애초 거론됐던 분홍색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실용성이 떨어지는 슈퍼 스포츠카가 법인차로 등록되는 것은 다소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1년에 수백대 팔리는 이들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을 막기 위해 전체 법인차 번호판을 새로 바꾸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수입차 업계에선 근본적으로는 '법인차=탈법'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항변도 있습니다. '부자 아빠 찬스'를 이용해 고가 차량을 굴리는 20·30대는 극소수이고, 법인차 대부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운행되거나, 성공한 개인사업가가 스스로 법에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사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그 자체로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은 아닙니다. '법인차는 뭔가 잘못됐다'는 전제로 다른 차와 구분을 짓는 '시각적'인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법인차=탈세'가 맞다면 법인차 구매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용 번호판 제도가 그렇게 되기 위한 건설적인 징검다리가 될지 오는 7월이 궁금해집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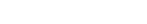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